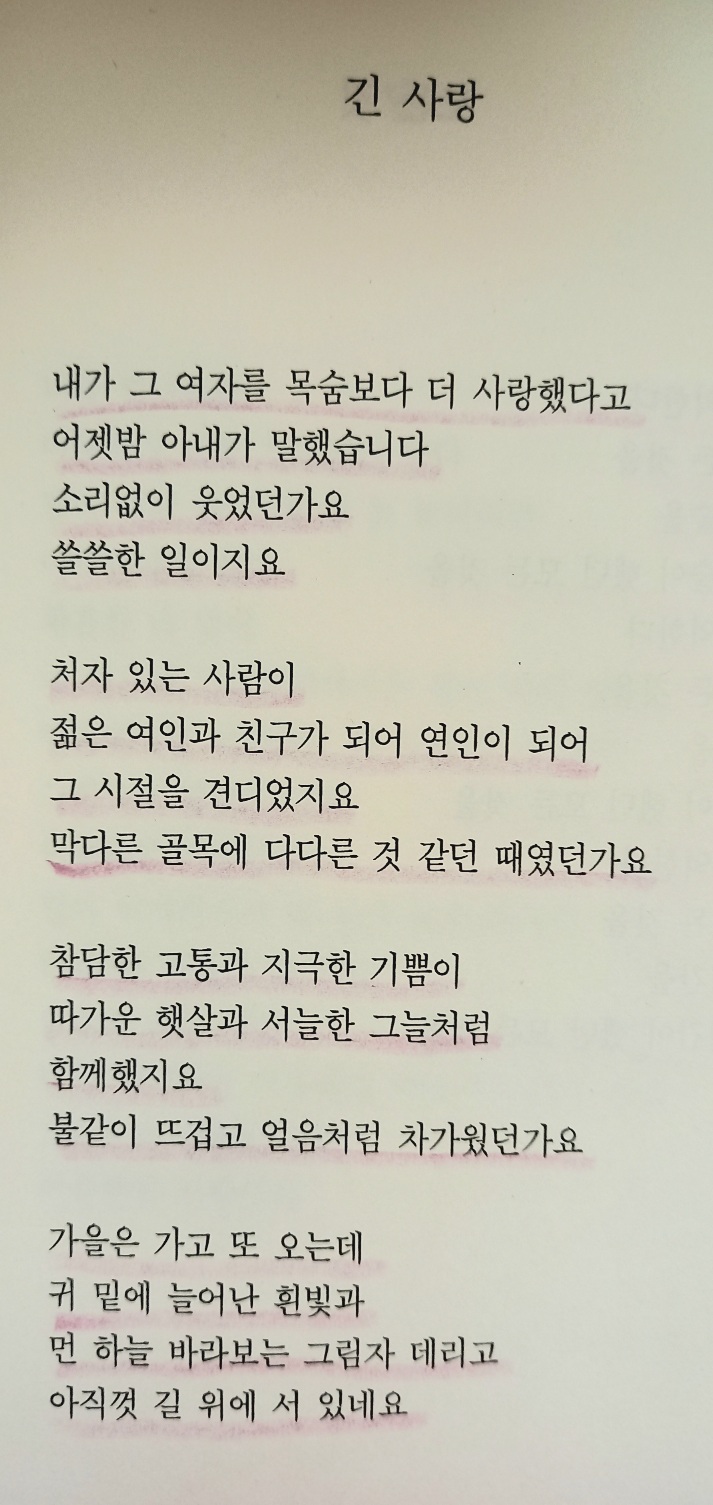All that fall
사무엘 베케트의 라디오 희곡 All that fall 읽었어요.
희비극이 절묘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었어요.
글솜씨와 구조에 감탄하여 웹을 뒤졌더니 연극으로도 올렸더군요 (아까움... -..-a)
물론 사전 뒤적이는 고문도 뒤따랐습니다.
큰 고통을 감내하니 만족이란 떡고물이 떨어지긴 했죠.
(번역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봤음, 때는 늦었으니-)
앞으로 이십 일 정도만 버티면 노트북을 장만하여 다시 놀아봐야죠.
자막을 만들며 영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니 소설을 봐도
영화처럼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 읽는 기쁨이 더 커집니다.
진작 젊을 적에 영화에 빠져살걸 왜 그러지 못 했나 쬐금 후회가 되기도 했죠.
우연히 들춘 영문판 두꺼운 책이 한때 무거운 시간을 가볍게 흩날려줍니다.
(근데 이 책이 누구 꺼더라? 쌔벼왔나? 친구가 두고갔나?)
다이 호우잉 '사람아, 아, 사람아' 다시 들춰봄.
세상은 그저 거대한 정화조임.
소혹성은 언제 충돌하려나...
읽은 김에 허수경 시집을 죄다 끄집어냄.
소혹성이 떨어질 바엔 적어도 직경이 150km는 되어야겠다고 생각함.
서정인 작가에게는 참 야박한 날라리 평론가들이다.
우리 문단에 이만큼 개성 강하고 응집된 묘사를 보여준 리얼리스트가 있던가 싶은데.
소시민이라면 기겁하는 평론가들은 그이 작품에는 흥미가 없고 그래서 늘 언저리로 밀어둔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하루키류 짜깁기 복제물에는 일제히 경탄.
시절이 바뀌니 카멜레온처럼 평론도 180도 바꿔었다.
주례사가 고작인 기생충들이여, 그만 빨아대라.
(지금은 또 누굴 빨아댈까 궁금하다)
시인 최영숙, 단 하나의 시집과 어린 딸을 남기고 떠나버린 시인.
늘 적막과 고립감에서 바라다보는 세상을 시로 그렸다.
반지하 방의 창문 너머로.
그리움일 게다.
누굴까, 누굴까 궁금했다.
기대하던 시인이었으나 그 이후론 마주대하지 못 했다.
그러다 이시영 시인의 시집에서 그이에 관한 시를 읽게 됐다.
저 하늘로 가버린 시인, 누가 그를 기억할까 여운을 남기며.
난 아직도 그 시인과 시를 잊지 못 한다.
아, 사람아.
가장 좋아하는 중편 중 하나, 윤영수 소설가의 '사랑하라 희망 없이'
암수 님 말마따나 모자르고 없고 부족한 것들이 기약없이 기대고 사는 삶을 그림.
신경림 시인도 그런 말을 했다지, 모자른 것들끼리 만나면 즐겁고 신난다.
꽉 짜여진 구조, 풍부한 인물들의 개성, 소설에 녹아 있는 문체가 언제 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에서 여주인공이 영원한 사랑으로 남기기 위해 사랑의 절정 속에 격류 아래로 뛰어내렸다면
이 소설은 부질없는 사랑을 위해 서로가 선을 넘지 않는다.
영화화 되었나요?
꼭 영화로 마주하기를 소원하는 작품.
'마틴 에덴' 새로 사야겠다.
완전히 새롭게 번역된 책이네.
개판으로 번역된 구닥다리 판본은 버려야겠다.
국어사전에 '개번역'이란 낱말이 실렸다, 크크.
얼마나 개번역이 많았으면...
'마의 산'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 하는 신세, 개번역이라서.
교수들은 강의만 하고 번역에 손도 대지 말았음 한다.
방치했던 책장을 치운다.
아무렇게나 책장에 던져뒀던 책을 꺼내.걸.레로 닦고 이리저리 옮겨본다.
그러다가 갈피에서 툭, 떨어지는 편지, 하나, 둘, 셋...
학창 시절, 사람들, 오래 덮어뒀던 그리움.
단 세 통으로.
그래서 책은 무익하고 위험하다.
보여야 할 고리끼 삼부작은 행방이 묘연하다.
그 시대와 이 시대를 구분할 지표가 있을까.
여전히 노동은 착취로, 이윤 도구뿐일진대.
더 거대해진 자본의 아가리로 빨려드는, 더 거대한 노동자 무리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진보와 희망은 단지 우리 안의 허상이었을 뿐.
책장을 정리하니까 장정일과 하루키가 각각 세 권씩 나왔다.
바로 재활용 폐기물로 내다놨다.
주인석, 하일지, 신경숙, 문열이 모두 내버렸다.
자꾸 버리고 싶어지는 이 마음...
(황지우도 버리기로 마음 먹었다)
다시 로자 룩셈부르크를 읽는다.
룩셈부르크가 루카치와 문학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양아치 루카치가 꼬리를 내렸고 로자 누님이 당연히 이겼지.
얼마나 꼬시던지.
누님이 소아마비란 걸 이제사 알았다.
유태인에, 여성에, 소아마비까지, 그럼에도 그니는 우뚝 섰다.
그래서 난 참 쪽팔렸다.
하는 김에 LP까지 정리했다.
청소년기의 버팀목이었달까, 추억이 새록새록.
김민기, 아말리아 로드리게츠,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OST, 김현식, 줄리엣 그레꼬, 조르주 무스타키, 마리안 훼이스풀, 제니스 이언...
아, 물론 페티 페이지도 있다, 내 영원한 큰누님! 크크크
태반이 1930년대에서 70년대이고 샹송 음반들.
노인네도 아닌데 왜 일찍 조로했는지 참나...
난 원래 그런 놈이다 저 날뛰는 세월에 대책 없이 수음하다
들켜버린 놈이고 대놓고 성기 흔드는 정신의 나체주의자이다
오오 좆 같은 새끼들 앞에서 이 좆새끼는 얼마나 당당하냐
한시대가 무너져도 끝끝내 살아 남는 놈들 앞에서 내 가시로
내 대가리 찍어서 반쯤 죽을 만큼만 얼굴 붉히는 이 짓은 또한
얼마나 당당하며 변절의 첩첩산중 속에서 나의 노출증은 얼마나
순결한 할례냐 정당방위냐 우우 좆 같은 새끼들아 면죄를
구걸하는 고백도 못 하는 씨발놈들아
- 호라지좆, 김중식
이 시에 반해 김중식 시인의 첫 시집을 덜컥 샀다.
(섰다가 아니라 샀다)
그리고 십년도 더 지나 다시 읽었다.
진짜 불끈 섰다.
드디어, 일단, 노트북을 지른 다음 os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암튼 골 빠개지는 것 같음.
(지르고나서 하드 추가하는 걸 까묵었다...)
이용악 시집을 다시 대했다.
참 좋았다.
늘 다시 대해도 뜨뜬하고 아련한 느낌들.
당시 천재 3인의 한 사람이었다지.
이용악, 오장환, 서거시기, 그 가운데 이용악 시인이 가장 끌린다.
월북작가 작품이 풀리면서 일제강점기, 해방공간의 시들이 살아났다.
드디어 읽을 만한 시들로 풍성해졌다.
이시백 작가의 '종을 훔치다'
이 나라의 교육 행태, 사립학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
난 얼굴을 모르니 작가인지도 몰랐다.
책을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잘 보시라며 만난 분들 모두에게 자필로 간지에 적어 건네주신다.
그제서야 '아, 이분이구나' 느끼던 흥분과 기쁨.
이분 글은 작가가 지향해야 할 덕목을 모두 갖췄다.
그 당시 송경동 시인의 자필이 적힌 시집도 받은 기억이 난다.
참 좋은 시인.
김수영 시인이라면 이분들 글을 굉장히 높에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
나해철 시인의 시.
잘 쓴 시다.
숨겨둔 이면을 슬쩍 들켜버리도록 만드는 힘,